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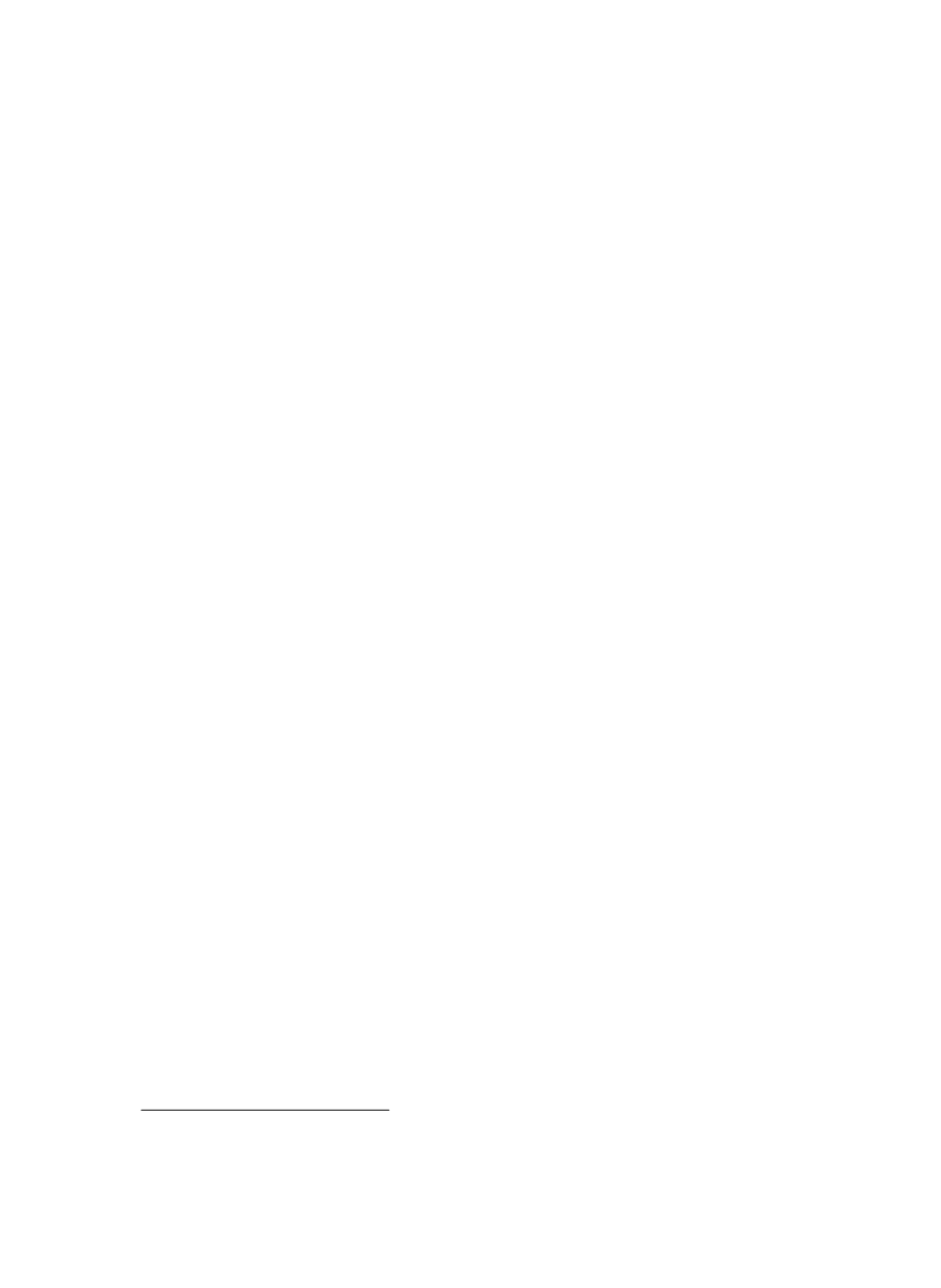
25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마드 성도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교회로 가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교회 이탈에의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규모가 작은 교회로 옮겨가도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발견한다면 노마드
성도는 거의 교회를 이탈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2. 차세대의 개신교 인식 하락
차세대들에 대한 종교 인식의 변화는 더욱 심각하다. 월간지 『교사의 벗』에서 강
정훈 목사는 “30년 전만 해도 교회 어린이들 대부분은 비신자 가정에서 출석했다. 지
금은 90%가 신자 가정이다. 비신자 어린이나 학생들이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다.”라
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27)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과 2012년 2년 간격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종교인 신뢰도와 종교 중요도의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에 나온 표에서와
같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와 중요도가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정도는 2010에 비해 2012년이 더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주
택인구총조사처럼 전수 조사로 본 통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지만(최근 조사 내
용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신교 비율의 개선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차세대들은
미디어를 통해 개신교의 부정적인 뉴스를 쉽게 접하고, 교회 문화의 폐쇄성 때문에 교
회를 점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는 이를 세속적인 문화를 차용하는 것
으로 차세대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는 표면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 문화의 탁월함에 길든 아이들에게 더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듯 차세대들의 종교
에 대한 신뢰도, 특히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 서서히 기독교 신앙의 비율이
차츰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개신교 미래의 준비를 위해 미리 연구하고 분석하며
갱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청소년 사역에의 투자만 더 많이 한다
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개신교의 신뢰 향상과 청소년 자체에 대한 심층 접근과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계나 교회에서 상당한 갱신과 연구
가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학교 현장에서 섬기는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와 사랑이 차세대에 대한 결정적인 열쇠를 쥐
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갱신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는 성인 성도들에 대한 투자의 비율이 차세대에 비해 상당한 격차로 크
27) 강정훈, “담임목사가 바라는 학생 관리”,
교사의 벗
2013년 9월호, 87.















